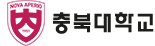지금 우리는 외화내빈(外華內貧)의 시대에 살고 있다. 외적인 문명의 화려함에 비하여 우리 내면의 영혼은 너무나 가난하고 불안정하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영혼을 깊은 곳까지 돌보고 구원할 수 있는 길 가운데 하나가 시를 쓰고, 시를 읽는 일이다. 한때 <시경(詩經)>으로까지 존재의 위상이 드높았던 시는 지금도 여전히 인간 영혼을 지키는 강력한 파수꾼이다.
금년도 신문방송사 현상공모 시부문의 응모작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비교적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총 29명이 응모한 134편의 시는 한결같이 시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고 있었으며 시를 본격적인 예술로 들어올리려는 노력을 숨결처럼 전해주고 있었다. 시란 마음을 고르고, 언어를 고르고, 문장을 고르는 고차원의 일이다. 잘 다듬어진 마음과 언어와 문장은 인간을 승화시키고 고양시킨다.
응모한 29명의 작품들이 보여주는 경향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인생 문제, 이성 문제, 가족 문제, 자아 문제 등을 다룬 것이 주종을 이루었고, 이보다는 적지만 자연과 우주의 문제, 일상과 현실의 문제 등을 다룬 것이 또 한 부분을 이루었다. 방금 언급한 데서 드러났듯이 흥미로운 것은 현실과 사회, 시대와 역사 문제를 다룬 경우가 매우 적고 인생론적인 문제나 개인사적인 문제를 다룬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점이다.
응모작 134편 가운데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작품은 조혜진의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그가 응모한 <5월 어느 날, 멀리 계신 님에게>, <내게로 와라, 아니다 오지마라> 그리고 <선창조의문(船艙弔意文)>은 인식과 형상, 사유와 미학이라는 두 차원에서 모두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시쓰는 사람으로서 진지했고, 삶의 높은 경지를 그리워하고 있었으며, 언어를 자유롭게 다룰 줄 알았다. 위의 세 작품 가운데서 특히 <선창조의문>은 방금 말한 바와 같은 장점을 가장 우수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여기서 우리들 모두를 숨조차 쉴 수 없게 만들었던 작년의 ‘세월호’의 비극을 속 깊이 읽어내었고, 그것을 절제의 힘으로 내면화시키면서, 인간이 가야 할 고처(高處)를 가리키고 있었다.
조혜진의 작품 다음으로 관심을 끈 것은 박정아의 것이었다. 박정아는 가족문제를 중심으로 소품에 가까운 작품을 쓰고 있었지만 <하얀나비>라는 작품에선 이런 평범함과 사소함이 그 나름의 영역에서 무르익어 질적 비약을 창출하는 한 실례를 보여주었다. <하얀나비> 속의 언어는 살아서 생동하며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고 있었다. 시를 읽는 첫 대목부터 마지막 지점까지 이 작품의 언어와 동행하는 과정은 매끄러운 길을 달리듯 유쾌하였다. 또한 이 작품은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사의 원형을 새로이 음미하도록 만드는 힘을 갖고 있었다.
위의 조혜진과 박정아의 작품 이외에도 김영훈의 <고양이>, 유도헌의 <잔디밭>, 김효선의 <스물>, 김정협의 <동생과 나, 어린> 등이 관심을 끌었다. 김영훈의 <고양이>는 살기 위해 겁조차 삼켜버린 검은 고양이의 눈에 대해 사색한 점이 이채로웠으며, 유도헌의 <잔디밭>은 잔디밭의 경고문인 ‘밟지 마시오’를 화두로 삼아 삶의 안팎을 사유한 점이 돋보였고, 김효선의 <스물>은 땅 속 뿌리들이 자신들의 스무 살을 끝까지 후원하고 밀어줄 것이라는 희망담론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김정협의 <동생과 나, 어린>은 엄마가 부재하던 유년기의 심리상태를 잘 묘사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미 비밀이 누설된 듯하나, 조혜진의 <선창조의문>을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그리고 박정아의 <하얀나비>를 가작으로 선정한다. 두 사람 모두 정정진(正精進)하여 시의 고처를 만나기 바란다. 그리고 응모한 다른 모든 이들도 시와 동행하는 고처의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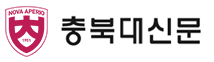
 종합
종합 취업
취업 대학
대학 사회
사회 광장
광장 사람
사람 특집
특집 문화
문화 동영상뉴스
동영상뉴스 포토&만평
포토&만평 학술
학술 현상공모전
현상공모전 문학
문학






 신문사
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