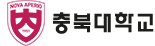약자가 강자를 섬긴다는 뜻의 ‘사대(事大)’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사대주의(事大主義)’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더 부정적이다. 사대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주체성 없이 세력이 큰 나라나, 강한 자에게 복종하고 섬기며, 자신의 존립을 유지하거나 빌붙고자 하는 의식’이다. 특히, 사대주의는 조선의 대중국 외교정책으로 맹위를 떨쳤는데, 우리 국민 대부분은 그것이 조선을 망국으로 이끈 원인 중 하나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각에 대해 ‘사대’는 억울한 면이 있다.
중국 역사 속에서 국가 간의 관계에서 사대가 처음 등장한 것은 중국의 고대 왕조인 주(周)나라 때로 제후 간의 침목과 상호불가침을 약속한 소위 사대와 자소(字小)의 예(禮)에서 시작했다. 이는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믿음(信)으로 섬기고(事大), 큰 나라는 어짐(仁)으로 작은 나라를 보호한다는 약속이다. 이후 중국이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성장하면서 주변의 약소국들은 중국에 대해 사대의 예를 행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완화하고, 자국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대외정책을 선택했다.
중국과 사대관계를 맺게 되면 약소국은 조공과 책봉을 통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주로 다음의 세 가지 점을 지켜야 했다.
첫째, 사대관계는 중국과 약소국 간에 군신 관계가 성립한 것이므로 약소국의 왕은 중국의 황제로부터 관직을 받고, 더불어 자국의 국왕으로 봉하여진다. 그러나 이것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중국 측의 의향을 타진하는 정도로 형식적 절차였다. 적어도 한족(漢族)이 세운 왕조에서는 왕의 인선에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일은 없었고, 약소국이 추천한 왕이 책봉되지 않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둘째, 중국 황제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중국의 연호(임금이 즉위한 해에 붙이던 칭호)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정치와 외교의 자율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셋째,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사절을 보내 사대의 예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일정량의 공물, 즉 조공을 중국 조정에 진상한다. 그런데 조공은 일방적인 진상이 아니어서 조공을 받은 황제는 합당한 답례품을 하사했다. 그런 이유로 조공사절을 부담으로 생각해 사양하는 일도 많았다. 한편 조공사절에는 상인들이 포함돼 있어 무역도 활발히 이뤄졌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사대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약소국의 대내외적 자율성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대를 굴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사대는 약소국이 강대국의 위협을 막아 자국의 생존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선택한 현실적인 대외정책일 뿐이다.
그런데, 사대는 지금도 유용한 대외정책인 것 같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미국은 우리에게 사대의 대상국이 되었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이 우리를 위협해서가 아니라 미국만이 우리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아직도 유효하다. 우리 국군의 전시작전권을 미군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아직 높고, 미국의 대외정책과 다른 우리만의 대외정책을 펼치면 한미동맹이 약화 돼 우리의 안보가 위태롭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집권해 있다. 이들에겐 한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2022년 기준 GDP 규모 세계 12위인 우리나라가 아직 약소국인가 보다. 미국에 사대하며 보호를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약소국말이다. 그래서 사대는 억울하다. 사대는 약소국이 자율성을 지키며 자국을 보존하는 현실적인 대외정책일 뿐인데, 사람들이 부정적으로만 봐서 억울하고, 깊은 성찰과 이해 없이 미국에 무조건 순종하는 대외정책을 사대라 불러서 억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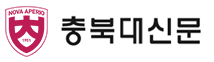








 신문사
신문사